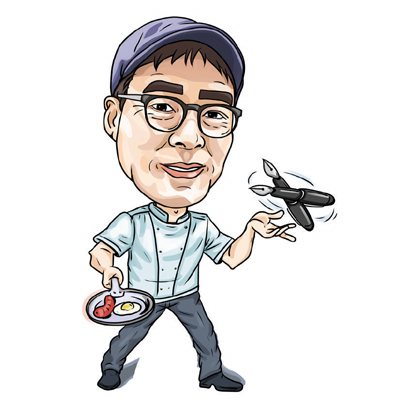
얼마 전 친구가 옛날 사진 몇 장을 스캔해서 보내왔다. 놀랍게도 40년 가까이 된 것들이었다. 갓 스물의 청춘이 거기 있었다. 타일로 만든 화덕 겸 탁자 위에 우리 친구들 넷이 소주를 기울이고 있다.
기억이 생생하다. 속칭 연안부두라고 부르던, 그러니까 지금도 건재한 인천의 유명한 생선회 타운이다. 가진 돈이야 빤했고, 우리가 머뭇거리자 주인아주머니가 이랬다.
“병어회 들어요. 싱싱하고 맛있다오.”옷차림을 보니 아마 초겨울이었을 거다. 그 시절에는 멋을 내느라 그랬는지, 정말로 옷이 없었는지 대개 청춘들은 홀딱 벗고 다녔다. 오리털이나 거위털 같은 게 흔하지 않던 때였다. 병어회는, 우리 같은. 서울내기들에게 별로 흔한 음식이 아니었다.
사실, 서울에서 회가 대중적인 음식이 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그나마도 시작은 거의 향어(이스라엘잉어)나 역돔(필라티아) 같은 민물 생선이었다. 바다 회라고는 붕장어가 고작이었다. 당시엔 남쪽 도시에서는 회 축에도 못 낄 녀석들이었다. 붕장어회를 시키면, 횟집 주인은 팔팔 뛰는 놈들을 수조에서 꺼내 고정 못이 달린 도마에 걸어놓은 후 껍질을 벗겨 저미고는 탈수기에 넣어 지방을 털어냈다. 붕장어는 기름기가 은근히 많은데, 구워 먹을 때는 지방이 좋지만, 회로 치자면 좋지 않은 맛이 난다 했다.
그래서 회로 내려면 기름기를 ‘탈수’(실은 탈지방)시켜서 냈다. 물론 시내에는 횟집 자체가 흔하지 않았다. 일식집 간판을 내건 정식으로 된 식당에서나 회를 많이 다뤘다.
활어를 넣어두는 수조가 기본이 된 것도 그 무렵이 시작이었다.
연안부두의 그 횟집에서 아주머니가 병어를 권한 건, 눈치껏 알만한 일이었다. ‘주머니 가벼운 너희들이 먹기에 딱 어울린다’ 그런 의미였다. 산낙지도 쌌고, 병어는 거저였다. 손질도 편해서 정식 횟집 구색도 아닌 막 썰어 파는 회타운의 한 귀퉁이에서 내놓기에 쉬운 안주이기도 했으리라.
병어가 그리 만만한 생선이 아니라는 건 20년이 지나 요리사가 되고 알았다. 이미 바다 사정이 바뀌어 병어가 잘 안 잡혔다. 스무 살 청춘에게 막 권하기에 좋던 생선은 이미 철 지난 기억이었다.
십여 년 전, 주방장인 나는 매일 새벽 네 시에는 일어나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장을 보았다. 요즘 반짝 영하 십 몇 도씩 내려가는데, 그 무렵 혹한이 와서 영하 이십 도를 내리 며칠씩 찍고는 했다. 수산시장의 모든 생선이 다 얼어버렸다. 활어를 취급하는 상인들은 물을 데워 활어조에 붓는 웃지 못할 광경을 연출했다. 냉동인지 냉장인지 알 수 없었다. 다 땡땡 얼어붙어 있었으니까. 병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 가게주인이, 바짝 얼어버린 덕자병어(아주 큰 고급 병어)를 낭패를 본 표정으로 주섬주섬 생선상자에 넣던 장면도 기억난다. 얼마나 크고 좋은 생물 병어가 얼어서 굳었는지 마치 하드커버를 씌운 도서관의 커다란 사전 같았다.
병어뿐이랴. 오징어와 고등어, 정어리가 흔했다. 얼마나 흔한지 그 시절, 그러니까 사오십 년 전 언저리가 되는 오래된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 늘 반찬으로 올랐다.
고등어는 가을부터 리어카에 실려 동네를 돌아다녔고, 주문하면 도마에서 탕탕, 내리쳐 내장 빼고 소금을 훌훌 뿌려 싸줬다. 비닐봉투가 비싼 때라 종이를 많이 썼다. 고등어조림은 그때 정말 기가 막혔다. 아마도 요사이 같은 한겨울이었을 것이다. 그런 고등어를 오랫동안 못 먹었다. 가격도 비싸졌고 크고 맛있는 놈을 못 보았단 뜻이다. 얼마 전에 부산에 갔더니 크고 훌륭한 고등어를 자갈치시장에서 보았다. 부산사람이 부러운 건 정말로 그때였다.
어찌 어찌 취업을 한 80년대말, 90년대초에는 가을이나 겨울에는 백반집 반찬으로 삼치가 흔했다. 등이 검게 푸르고 뱃가죽이 회색인 멋진 삼치. 그런 삼치를 1000원짜리 백반집의 반찬으로 내곤 했다. 그때야 그런가보다 하고 먹었지만, 이내 그런 귀물은 따로 몇 만원을 줘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걸 몰랐다. 그만큼 삼치도 흔했다. 도루묵도 비슷한 놈이었다. 가을에 서울사람들도 도루묵찌개와 구이에 이골이 났다. 쌌으니까 가능했다. 이제는 뭐든 비싸다. 안 잡혀서 비싸고, 잡혀도 어로 비용이 올라서, 바다에 나갈 사람이 없어서, 대체 인력인 외국인들이 코로나로 들어오지 못해 비싸다. 생선 한 토막에도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웃고 지나가지 못할 엄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당도해 있는 셈이랄까.
기름 오른 두툼한 고등어 한 조각 해서 하얀 쌀밥을 먹고 싶다.


